‘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개발독재에 의한 경제성장은 경제적 후발주자였던 한국을 세계가 주목하게 만드는 중요한 모멘텀이었다. 하지만 그 성장신화의 이면에는 척박한 노동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밤을 잊은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들의 인권탄압이 공존하고 있었다. 여전히 지금도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국가들 중에서 그리스, 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는 문재인정부와 함께 새로운 노사문화와 노동관행을 정착시켜야만 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이미 많은 근로자의 로망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일 권하는 사회’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즉 201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그리고 4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부칙 제1조 제2항).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를 통해 단위기간, 즉 3개월 평균을 내 한 주에 총 52시간의 노동시간만 넘기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특정한 주에 일을 더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 내용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우선 절차상 요건과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근로자대표’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통상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 때 노조대표가 근로자대표로서 서면합의의 주체가 될 수 있겠지만,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가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 초래된다.
더 나아가 현재와 같은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서는 사용자가 특정한 주에 산술적으로 최대 64시간 근로를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하루 최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최소 연속 휴게시간 규정 또한 없다. 만일 단위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으로 길어진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최근까지도 진통을 겪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왜 난항을 겪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우리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결코 안겨줄 수 없다. 이러한 근로조건과 노동현실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문제라면 결정을 위한 답은 명백해진다. 문제는 건강과 안전만이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탄력근로제를 적용한 주 52시간까지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질 필요가 없게 된다. 반대로 근로자로서는 특정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29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 개정안에서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만성과로로 인한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WHO 산하기관 국제암연구소가 야간근무를 2A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개정 「근로기준법」이 건강한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안전장치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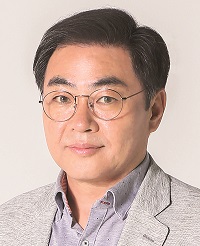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