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장애인 인권침해의 끝은 어디인가? 최근 남원시 소재 지적장애인 시설 “평화의 집” 인권침해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장애계와 사회복지계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그날의 평화의집 일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은,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할 만큼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현장이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평화의집 사태는 전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며 장애계의 분노와 경악은 물론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실종된 채 그 자리를 감동 없는 사죄와 반성이라는 형식논리가 대신하고 있다.
남원판 도가니로 회자하고 있는 평화의 집의 아픈 기억은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를 근절하지 못하고 왜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호막 없는 인권침해의 무기력증은 인권 자체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권은 생명처럼 존중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인권은 그간 억압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에 의해 획득된 결과물인 만큼, 그 속에는 약자우선의 원칙이 대전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특권과 예외에 맞서온 인권의 역사는 그래서 그 밑바탕에 인권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 인권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기도 하며, 다수자의 향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이 곧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장애인 인권에도 예외일 수 없다. 장애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차이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기회적 평등은 물론 특수 상황적인 조건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장애인 인권의 핵심이다. 우리사회에서 행해지는 장애인 인권파괴의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평등에 대한 인지부조화 문제라고 생각한다. 차별은 폭력을 낳고 폭력은 또한 인권유린을 낳는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악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 인권을 파괴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역사 속에 갇힌 ‘과거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식조차 희박한 관련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장애가 개인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특성이자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 사람을 구분 짓고, 능력이나 가치까지 의심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장애에 관한 편견과 차별은 그 사회의 생산양식과 중심가치 사이의 관계를 통해 생산되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연결고리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권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작위적인 판단이 아니라 당위성이다. 1948년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1975년 ‘세계 장애인 권리 선언’은 이러한 당위성에 근거한 윤리강령이자 행동강령 아니겠는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무지의 소산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맡길 수도 없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법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장애인 인권이 실정법에 보장된 만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시민사회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장애인 옴부즈만의 역할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로우의 외침이 가슴을 울린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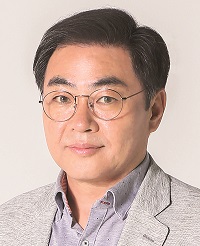 |


